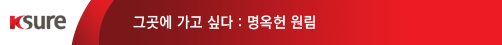그곳에 가고 싶다 | 명옥헌 원림
문턱 없는 모두의 정원

명옥헌 원림은 고졸한 정자와 배롱나무, 소나무 등이 어우러져 멋스러움을 자랑한다. 개울물 소리가 옥구슬 흘러가는 소리와 같다 하여 명옥헌(鳴玉軒)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툭. 고즈넉한 풍경에 낯선 소리가 끼어든다. 그러나 잠시 갸우뚱거리기만 할 뿐, 이방인은 꿈결 같은 풍광 속으로 계속 걸어 들어간다. 몇 걸음이나 떼었을까. 툭. 또다시 같은 소리가 발길을 잡아끈다. 그의 앞에는 잘 익은 감 하나가 땅에 떨어져 뭉그러져 있다. 어느 시인은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떨어진다”며 이 계절을 표현했지만, 이곳에서는 감이 떨어지는 소리로 풍성한 가을을 실감한다. 명옥헌 원림에도 어김없이 가을이 무르익고 있다.
광주광역시 동북방향, 무등산 북쪽 기슭과 맞대고 있는 담양군 고서면과 봉사면 일대에는 참으로 많은 누각과 정자가 자리 잡고 있다. 소쇄원, 면앙정, 송강정, 식영정 등이 증암천을 사이에 두고 좌우 언덕에서 서로를 마주 보고 있는데 하나같이 아름다운 경치를 뽐내며 수많은 시상을 자아내게 한다. 그리하여 누정(樓亭)을 연구하는 건축학도, 가사(歌辭)를 공부하는 국문학도들의 답사코스로 사시사철 성시를 이룬다.
하지만 명옥헌 원림은 원래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다. 우리 문화에 조예가 깊은 유홍준 교수조차 1989년 처음 그곳을 찾았을 정도니(나의 문화유산 답사기1), 세상 사람들이 알 리 만무했다. 다른 정자엔 수십 개씩 걸려 있는 현판도 ‘명옥헌(鳴玉軒)’ ‘삼고(三顧)’라고 적혀 있는 두 개가 고작이고, 전하는 시도 남간 유동연의 연작시 다섯 편뿐이다. 오랜 시간 조용하게, 소박하게 자리를 지켜온 셈이다.


명옥헌은 다른 정자와 달리 마을 바로 곁에 터를 잡고 있어 30여 가구가 올망졸망 모여 사는 후산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야 비로소 가 닿을 수 있다. 거대한 느티나무가 우람하게 서 있는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명승 58호 명옥헌을 지킵시다’라는 현수막이 눈에 띈다. ‘잘 찾아왔구나’ 하며 초행길의 나그네가 안도할 무렵, 두 갈림길이 나온다. 하지만 어려울 건 없다. 집집이 마을 특산물인 감, 대추 등을 그려 넣은 담벼락 벽화에는 친절하게도 화살표와 ‘명옥헌 가는 길’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다. 소담한 벽화를 보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면 된다.
마을 뒤 야트막한 둔덕에 오르면 드디어 명옥헌 원림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벽화가 일러주는 대로 ‘30미터’, ‘10미터’를 마음속으로 카운트했지만 이렇다 할 예고도 없이 나타나는 명옥헌 원림은 당혹스럽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다. 담장도 없고, 대문도 없이 한눈에 펼쳐지는 풍광이 가슴에 폭 안긴다. 담장과 대문이라는 프레임이 있었다면 그림 속 풍경이라 해둘 터이나 그마저도 없으니 꿈속의 장면이라 해야 할까. 홀린 듯 꿈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기실 명옥헌 원림의 백미는 배롱나무꽃(목백일홍)이 만개해 자주색 꽃구름에 잠기는 8월. 뜨거운 여름 한철을 누구보다 붉게 불태웠을 배롱나무꽃은 자취를 감추었지만 대신 다홍빛 상사화(꽃무릇)가 고개를 치켜들고 있다. 초록색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은 연못에는 소금쟁이가 열심히 물 위를 미끄러지고 있고, 수생식물들은 뜨거운 가을 햇볕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풍경을 언덕 위 정자가 내려다보고 있다.
명옥헌을 꾸민 사람은 조선 후기 학자 오이정(1619~1655). 그는 천연두를 앓다 41세에 단명한 아버지 오희도를 기리기 위해 아버지가 평소 기거하던 이곳에 정자를 짓고 네모난 연못을 판 뒤 ‘명옥헌’이라 이름 지었다. ‘명옥(鳴玉)’은 옥구슬 소리라는 뜻으로 정자의 서쪽 계곡에서 흐르는 개울물 소리가 마치 옥구슬이 부딪치는 소리처럼 들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옛 선비의 소탈함이 배어 있는 단출한 정자에 앉아 귀를 기울여본다. 여전히 서쪽 계곡은 옥구슬 부딪치는 소리를 자아내고 있다. 졸졸졸 귓가를 적시며 계곡 물은 정자 옆 작은 연못으로 흘러들어 간다. 연못에는 특이하게도 작은 물길이 두 개 나 있다. 하나는 위쪽에서 흘러들어 오는 물길로 연못을 채우고, 다른 하나는 아래쪽으로 빠져나가는 물길로 다시 개울로 합류하게 된다. 괴어 있으나 흐르는 연못. 생경한 구조를 찬찬히 들여다보니 명옥헌을 정원이 아니라 원림이라 부르는 이유를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


원림의 풍광이 한 폭의 그림처럼 담기는 정자에 앉아(왼쪽) 길목 카페에서 주문한 차 한 잔 마시면 세상 더 바랄 것 없을 것 같은 행복에 빠진다.
정원(庭園)은 인위적으로 조영한 공간을 뜻하지만 원림(園林)은 자연형태에 약간의 인공미를 가미한 곳이다. 인공적으로 연못을 파고, 동산을 만드는 일본식 정원과는 달리 한국의 전통 정원인 원림은 자연의 형태를 그대로 이용하여 그곳에 최소의 손질만을 가한다. 약간의 ‘인위’만으로 흐르는 물길을 연못으로 바꾸는 명옥헌의 지혜처럼 말이다.
하지만 명옥헌은 원림(園林)이라는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원림(苑林)이라 표기한다. 이는 담장의 유무 때문이다. 담장을 둘러서 개인 소유의 공간으로 삼으면 원림(園林)이 되지만 명옥헌은 담장을 만들지 않고, 숲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해 원림(苑林)이 되었다. 이곳은 과거 선비와 유생들뿐 아니라 흙투성이 농부에게도 자리를 내어주는 곳이었다. 누구 하나가 아니라 모든 이를 품을 수 있는 아량을 명옥헌은 베풀었다.
이 같은 너그러움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담장은 없고, 관광객을 통제하는 관리인이나 소정의 입장료도 없다. 정자에는 다른 고택이라면 으레붙어 있을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안내문조차 없다. 덕분에 사람들은 명옥헌을 실컷 마음속에 담아간다. 정자에 앉아 차 한 잔의 운치를 누리기도 하고, 문을 사방으로 열어젖히고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기도 한다.
댓돌 위에 신발을 벗어 놓고, 마루에 오른다. 조심스레 문고리를 풀어 창호지 문을 활짝 열자, 뒤에 서 있던 또 다른 객(客) 하나가 감탄을 쏟아낸다. “우와, 시가 절로 나오겠네!” 그 마음이 나의 것과 똑같았다. “옥구슬 소리/ 자장가 삼아/스르륵/ 잠이 드니// 고졸한 정자/ 황홀한 연못/ 내 마음에/ 어리네// 꿈에 본/천상 낙원/ 눈 비벼도/ 사라지지 않누나.” 그 옛날 문인들의 유려한 시 한 수에 견줄 수 없으나 이곳에서는 누구나 시인이 된다.
떠오르는 시상을 정리하며 명옥헌을 떠나는 길, 맞닿아 있는 인가(人家)에서 키우는 닭 한 마리가 주위를 노닐고 있다. 마침 주인 할머니도 대문짝에 나와 계신다. “할머니, 명옥헌은 누가 관리해요?” 해결하지 못했던 궁금증 하나를 여쭌다. “마을 사람들 다 같이 하는디?” 대답을 듣고 나니 ‘필요 없는 질문을 했구나’ 싶다. 모두의 정원은 모두가 가꾸어야 하는 법이니까. 우리 모두는 가까이 있어 친근하고 자연 그대로여서 평온한, 명옥헌의 주인이다.
| 위치 |
담양군 고서면 후산길 103길 문의: 061-380-3752 교통정보: 광주 두암동 정류소에서 담양 고서 방면 군내 버스 이용, 1일 10회 운행
글 김윤미 기자 | 사진 최순호
출처 : 월간샘터 2016년 11월호 (http://www.isamtoh.com)